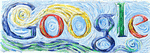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전례력 연재] 전례력과 성인 시성
Saturday, May 26th, 2018
전례력과 성인 시성1
주낙현 요셉 신부 (서울주교좌성당 – 전례학 ・ 성공회 신학)
최근 천주교의 프란시스 교종은 오는 10월 14일 교종 바오로 6세와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를 시성(諡聖)한다고 발표했다. 바오로 6세(1897-1978)는 2차 바티칸 공의회 도중에 별세한 요한 23세 교종(2014년 시성)을 이어 교회 개혁을 이끌었다. 1966년 성공회 마이클 램지 캔터베리 대주교를 16세기 교회 분열 이후 처음으로 교황청에 초대한 분이다. 교회 일치에 큰 공헌을 해서 ‘대화의 교종’으로도 불린다. 오스카 로메로(1917-1980)는 엘살바도르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가난한 민중에 편에서 사목했다. 미사를 봉헌하는 도중에 총에 맞아 순교했다. 엘살바도르의 첫 공식 성인이 된다.
시성 전통은 오랜 역사만큼 다양하고 그 이해도 교단마다 다르다. 처음에 교회는 성인을 순교자에 한정했다. 순교자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지켜낸 분이다. 교회는 순교자의 무덤과 유해 위에 제대를 올리고 성당을 지었으며, 그에 따라 성당 이름도 정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4세기 이후 박해가 끝나자, 신앙인이 생전에 보여준 신앙의 가르침과 덕행에 따라 성인을 정했다. 성인이 살았던 지역에서 자연스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성인숭배가 남발하자 서방교회에서는 점차 엄격한 시성 절차를 거쳐 주교가 결정했다. 10세기에 이르러 교종만이 결정권을 갖게 됐다. 천주교는 시성을 ‘탁월한 신앙의 위인을 성인의 품위에 올리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신앙인에도 위계질서가 있다는 냄새가 풍긴다. 해당 성인과 관련된 기적도 필수 조건이다. 대중 신심의 문화가 배어 있다.
성인의 신학은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위기)는 성서에 바탕을 둔다.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신앙의 본분에 따라 살면 신앙인 모두 ‘거룩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신자를 늘 ‘성도’(saints)라고 불렀다. 성인은 ‘품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방교회인 정교회는 초대 교회 관습을 여전히 따른다. 성인의 지정은 여러 청원에 따라 지역 교회와 주교가 검토하여 선포한다. 정교회는 성인을 사도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교회의 교부들과 주교들, 수도자들, 그리고 신앙의 의인들로 범주를 나눈다. 천주교 관습인 기적의 유무와 횟수는 따지지 않고, 그가 보인 거룩한 삶과 그 가르침이 정교회 ‘정통’ 교리에 합당한지가 더 중요하다.
성공회는 성서의 성인 신학에 기초하면서도 동서방교회의 역사가 마련한 성인을 존중한다. 성공회에서 천주교와 같은 형태의 시성은 ‘순교자 성인 찰스 1세’ 이후로 없다. 그를 서방교회의 여러 성인과 함께 기도서 전례력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성공회는 서방교회 전통을 존중하여 16세기 개혁 이전의 성인을 인정하되 이후로는 신앙의 위인에게 ‘성’(saint)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성서가 말하는 ‘거룩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역사의 신앙인들을 전례력에 넣어 기념한다. 이는 관구 교회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성공회에서는 이름 앞에 붙은 ‘성’(聖) 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한성공회는 전통적인 ‘성인’에게만 한정했던 1965년 기도서에 큰 변화를 주었다. 1999년 시험교회예식서를 시작으로 2004년 기도서에 전례력에 수많은 ‘성인’을 넣어 기념한다. 교단과 시대를 막론하여 ‘거룩한 신앙인’을 더 많이 포함하여 따르려 한다. 성인의 신학과 전통에서는 성공회의 품이 더 넓다.
- 성공회신문 2018년 5월 26일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