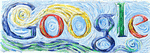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전례력 연재] 성도의 상통 – 추석의 신학
Saturday, September 22nd, 2018
성도의 상통 – 추석의 신학1
주낙현 요셉 신부 (서울주교좌성당 – 전례학 ・ 성공회 신학)
<성공회 기도서>(2004년)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주요 축일’로 정하고, 주일과 겹칠 때는 주일보다 우선하여 지키게 했다는 점이다. 축일 지정의 전통에도 맞고 우리 문화 존중의 태도를 잘 표현한 일이다(기도서 27쪽). 그런데 명절을 축일로 지키는 일에 관해서 여러모로 살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성도의 상통’ 교리를 명절 예배의 근거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조상 추모 예식을 조정하여 실천해야 한다.
<기도서>는 추모 예식의 신학 근거를 ‘성도의 상통’ 교리라고 분명하게 밝힌다(806쪽). ‘성도의 상통’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의 끊이지 않는 교제를 말하는 정통 그리스도교의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구분이 없다. 교회는 역사의 모든 신앙인을 ‘성도’(saints)라고 부른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 공간이고 예배는 그 시간이다. 하늘과 땅에서 같은 성도로 서로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별세자 추모를 교회에 모여서 했다. 순교자를 기억하고 먼저 떠나간 가족, 동료 신앙인을 추모하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였다. 그러나 중세를 거치면서 공동체의 추모 예배는 가족 중심의 사적인 ‘연(煉)미사’로 변했다. 말 그대로, 연옥의 영혼을 위하 드리는 미사라는 뜻이다. 원래는 사목적인 위로와 희망을 담았던 ‘연옥’ 교리가 변질하여, 별세자의 영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부패가 횡행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연미사’ 뿐만 아니라 ‘별세자를 위한 기도’를 없애고, 추모 예식의 의미를 깍아내렸던 이유다. 성공회는 중세의 잘못을 반복하지도 않고, 종교개혁자들의 속 좁은 태도를 따라 하지도 않았다. 늘 ‘성도의 상통’ 신학으로 중심을 잡았다.
한국에서는 왜 교회 안에서 추모 예식을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상 제사와 미신을 없앤다는 이유로 교회의 예법에 따라 교회로 모여 드리게 했다고 추측한다. 제사 관습을 멈추게 하고, 미사와 예배 안에서 신앙 교육 효과를 얻는 방법이었겠다. 이제 선교사 시대를 벗어난 교회는 그리스도교 전통과 우리 관습의 본래 뜻을 함께 헤아려서 새로운 길을 터야 한다.
가족 전체가 신앙인이라면 명절 예배를 성당에 모여서 드리면 좋겠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에는 제대 앞에 소박한 음식상을 차리고, 우리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신자들의 기도 부분에서 여러 성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성인 호칭 기도에 이어, 별세한 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다. 기도 후에 신자들은 제대를 향하여 모두 정중히 목례하고,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눈 뒤, 성찬의 전례로 이어가도록 한다.
가족 안에서 종교가 서로 달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명절 예식을 두고 다른 종교 관습 때문에 갈라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신앙인의 도리이다. 이때는 성당보다는, 가정에서 드리면 좋겠다. 우리 전통의 음식상을 소박하게 차리고, 절을 할 수도 있다. 신위를 놓지 않고, 초혼(강신) 없이, 순서에 따라 말없이 행동으로만 예를 표한다. ‘성도의 상통’ 신학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뒤에 가까운 조상에 관한 기억을 나누는 순서를 갖고, 기도서에 있는 추모 예식 전체나 일부분으로 마칠 수 있다.
예식 준비와 실행에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절 횟수는 두 번으로 하되, 남녀 구별은 두지 않는다. 음식상은 ‘제사상’이 아니라, 예가 끝나면 상을 곧바로 옮겨서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상차림으로 한다. 여성의 가사 노동이 가중되는 명절 풍습을 신앙인이 먼저 바꿔야 한다. 복잡한 제사상 관습은 오랜 전통이 아니라 조선 말 신분 질서가 어지러워지면서, 저마다 ‘양반 제사상’을 흉내내어 정착했다. 그 노역은 조선의 ‘종’들에서 근대의 ‘여성’으로 넘어왔다. 이를 끊어야 한다.
- 성공회신문 2018년 9월 22일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