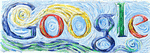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전례력 연재] 숫자의 상징과 신앙생활
Saturday, July 14th, 2018
숫자의 상징과 신앙생활1
주낙현 요셉 신부 (서울주교좌성당 – 전례학 ・ 성공회 신학)
그리스도교 안에서 숫자는 여러 상징으로 쓰이고 다양한 뜻을 지닌다. 숫자 자체는 뜻이 없지만,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드러내는 의미로 쓰였다. 수는 달력과 셈법처럼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 신앙의 뜻을 더해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의 숫자 상징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따라 새롭게 배열하고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뜻을 붙이기에 따라 모든 숫자가 의미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대표 숫자 상징은 1, 2, 3, 6, 7, 8, 40, 50 등이다.
일 (1) – 첫 시작과 기원을 뜻한다. 성서에서 창조의 시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다른 ‘잡신’을 넘어선 유일한 하느님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치를 뜻한다.
이 (2) – 성서에서는 대립하는 여러 성격과 사건을 비교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에 자주 쓰였다. 제대에 촛불을 두 개 올려놓은 관습과도 관련이 있다.
삼 (3) –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한다. ‘삼’은 고대 사회와 종교, 철학과 수학 등에서도 자주 쓰여 ‘온전한 완성’을 뜻한다. 성서의 사용은 더 다채롭다. 예수 변모 사건을 증언한 세 제자, 그리스도의 십자자 수난 세 시간, 셋째 되는 날의 부활을 생각하게 한다.
육 (6) –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날의 숫자다. 그 탓에 인간과 그 연약함을 뜻하기도 한다. 이 연약함이 자기중심으로 흐르면 큰 악이 된다. 묵시록에 나오는 악의 숫자 ‘666’이 그것이다.
칠 (7) – 삼(3)처럼 완전함을 뜻한다. 구약에서는 창조가 완성된 날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위 예수의 일곱 말씀, 성령의 일곱 열매를 말할 때도 쓰인다. 역사에서 마리아의 일곱 슬픔과 인간의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목록에도 쓰인다.
팔 (8) –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팔’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간은 과거 역사의 쳇바퀴인 일(1)로 돌아가지 않는다. 부활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창조인 탓이다. ‘팔’은 구약에서도 할례 날짜로도 쓰였지만, 신약 이후 ‘새로운 할례’인 세례의 뜻으로도 변화했다. 세례대나 세례당을 팔각형으로 만든 이유이다. 전례력에서 대축일을 작은 절기로 지키는 ‘팔일부’도 여기서 비롯했다. 또한, 팔은 칠 더하기 일(7+1=8)이라는 셈법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부활 은총은 기존의 완전함(7)에 하나를 더한 풍요로움을 드러낸다.
사십 (40) – 시험과 고난을 상징한다. 이 숫자는 성서에 빈번히 등장한다. 사십일 밤낮 비와 홍수, 이스라엘의 광야 사십 년, 모세의 시나이산 사십일 거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사십일 생활 등이다. 여기서 사순절의 절제와 극기 관습이 나왔다.
오십 (50) – 부활의 완성과 새로운 몸의 탄생이다.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에 이르는 시간이다. 부활은 성령 하느님이 내려서 신자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만드는 일로 완성된다. 구약의 희년(50년마다 해방과 안식) 사상을 이어받았다. 예수의 부활은 이제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어 세상에서 펼치는 희년 실천이라는 말이다. 다시 여기에 사십 더하기 십(40+10=50)의 셈법이 등장한다. 부활은 고난보다 더 길고 풍성하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별세를 불교 관습의 49재가 아닌 부활의 50일째 자주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성공회신문 2018년 7월 14일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