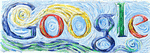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전례력 연재] 역사의 전환 – 세례자 요한 탄생
Saturday, June 24th, 2017
역사의 전환 – 세례자 요한 탄생 (6월 24일)1
주낙현 요셉 신부 (서울주교좌성당 – 전례학 ・ 성공회 신학)
성인들 가운데 탄생 축일을 정하여 지키는 분은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 두 분이다. 정교회 성당에는 제대를 둘러싼 성화벽(이코노스타시스)이 있다. 예수의 이콘을 중심으로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 이콘이 양쪽 곁을 지킨다. 성모 마리아만큼 세례자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에 관련이 깊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교회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관련성을 축일 지정에도 반영했다. 4세기에 성탄절이 지정되고 6세기 초에 요한의 탄생 축일을 정했다. 성탄절에서 정확히 6개월 앞선 날짜이다. 다만, 6월 24일인 까닭은 다음 달 첫날부터 8일 전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12월과 6월은 하루 차이가 난다). 요한과 예수는 태어난 시간 차이만큼 자기 역할을 달리했고, 그 같은 날짜만큼 쌍둥이처럼 삶의 궤적을 같이 했다.
성서의 기록과 교회 전통은 세례자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와 늘 비교하여 역사의 전환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첫째,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전환이다. 세례자 요한은,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여겼던 즈가리야와 엘리사벳 부부에게서 태어났다. 즈가리야는 늙은 남성 제사장이었다. 그는 천사가 전하는 요한 수태고지를 믿지 못했다. 그 탓에 그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 하게 된다. 반면, 예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난다. 마리아는 젊은 여성이고 시골뜨기다. 그는 천사가 전하는 예수의 수태고지를 믿는다. 마리아는 입을 열어 마리아 송가로 하느님을 찬미한다. 이 비교에서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남성과 여성, 제사장과 시골 무지렁이, 그리고 믿지 않음과 믿음이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세대와 성, 지위와 행동의 전환이 뚜렷하다.
둘째, 선구자와 주인공의 전환이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다. 회개의 징표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행실을 그치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외친 선구자였다. 반면,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이뤄지는 현실을 보여주신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그를 따르는 이들을 ‘벗’이라 부르신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벗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몸소 살아가는 주인공이시다.
셋째, 선포와 실천의 전환이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 예언자 전통을 완성했다.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한편, 예수는 ‘하느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다. ‘말씀의 선포’를 넘어서서 ‘말씀의 실천’으로 전환되었다.
이 전환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분별한다. 정교회에서는 9월 23일을 세례자 요한 수태고지로 지킨다. 추분이라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이다. 예수 수태고지 3월 25일은 춘분이라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세례자 요한이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한다”(요한 3:30)는 말이 반영된 축일 날짜이다.
이런 비교는 두 분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역사의 전환을 말한다. 옛 시대를 아름답게 마감해야 더 놀라운 새 시대가 펼쳐진다. 먼저 된 사람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깊은 통찰이다.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신앙인이 된 사람, 먼저 서품받은 사람, 먼저 배운 사람은 자기 경륜에 사로잡히기 쉽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자기 세대에서 역할을 끝내고 미래 세대의 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자기가 여전히 역사를 이끌고 간다고,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고집과 아집이 생겨난다. 이런 집착은 그동안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눈을 가린다. 역사의 장애물이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이 아집이 만든 역사에 전환을 촉구한다.
- [성공회 신문] 2017년 6월 24일 치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