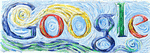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성직자’ 잡감
Monday, January 12th, 20091.
성직자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자기 검열에 시달린다. 위계를 전통으로 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 질서의 압박감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각양각색의 신자들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무엇보다 고민 많은 한 신앙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이는 이를 잘 피해나가는 것이 경륜이자 지혜라고들 하나, 여럿을 보건데 자기 합리화로 들리곤 했다. 그 말들에 사실 행복한 얼굴이 묻어나지 않은 탓이다. 자기 검열에 먹히는 일이 빈번하다.
나 역시 자유롭노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 몇 번이나 그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거니와, 하루에도 몇번씩 다짐과 생각을 고쳐 먹는다. 도전을 객기로 여기고, 슬픈 자포자기를 도통으로 여기라는 충고가 앵앵거린다. 철 들라는 소리와 함께.
2.
그러나 성직자는 혼자가 아니어서 사제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새로운 도전을 일깨운다. 저마다 부족한 것들이지만, 사금파리로 모여 듬성듬성 삶의 빈 곳을 매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희망을 저버리거나, 무관심하면?
아마 조급증이었으리라. 이런 절망과 무관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독버섯 피어나듯 하여 우리 그늘을 좀먹고 있다는 생각. 햇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지친 삶을 서로 기대어 쉬는 자리가 아니라, 축축하고 써늘하게 습진 동네가 되어 버린다는 생각. 이 조급증이 사람살이의 복잡한 일을 내밀하게 살피지 않고 간섭하도록 나를 떠밀었는지 모른다.
3.
몸이 이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는 탓도 있겠다. 첨단 테크놀로지로도 몸이 함께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그 간극을 좁히고 싶고, 내 깐에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그 사이에 어떤 소통이 마련된다면 족할 일이라서 해서 블로그니, 포럼이니, 인터넷 지식 프로젝트니 하는 것에 기운을 주고 있었다.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문에 걸어 놓았다. “성공회 카페는 신앙과 지식과 성찰이 어우러져 새로운 지혜와 실천을 열고자 하는 공감의 목소리와 공명의 메아리를 담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빈수레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4.
유혹이었는지도 모른다. 외로움을 피하고 싶었을 게다. 그도 아니면 나서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을까?.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동안에, 길동무[道伴]인 신부님은, 같은 물음을 하느님께 물어 그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한다. 내공의 차이다.
네가 너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을 많이 얻어
교회의 세력을 이루었다면
그 어울림과 권력의 맛에 취하여
반드시 하느님도 사람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네 외로움, 네 모자람, 네 어리석음 때문에
너는 나를 향하여 나의 길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다.
5.
어디에다 적었던 글들의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배운 바 없지 않으니, 다른 식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대화와 나눔이 없으면, 자랄 수도 풍요로워질 수도 없다. 이것이 자기 검열을 넘어, 좀더 넓고 깊은 자기(‘우리’) 수련과 도전으로 이끌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를 몸으로 살지 않고서야, 미사에서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몸”을 운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