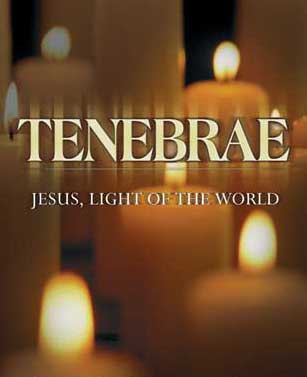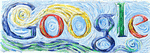성 목요일: 켜켜이 쌓인 시간들
Thursday, March 20th, 2008성삼일(Holy Triduum)은 교회력 혹은 전례력에서 경첩점(hinge point)이라 하겠다. 구속사의 모든 사건들이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밤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러 새로운 사건으로 도약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 목요일은 이런 전환의 시작점이다. 사순절의 끝나는 지점에서 성삼일이 시작된다. 무엇보다 이 날은 예수와 함께 했던 세월들이 다다르는 수렴점이자, 그 수렴의 끝에서 새로이 드러나는 또다른 시간이다. 이 날은 그래서 켜켜이 쌓인 시간들, 혹은 시간의 중첩이다. 예수께서 공들인 삶은 오늘 있은 두 사건에 집적되어 있다. 세족과 마지막 만찬이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종의 일을 주인의 일로 전복시켰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는 그들도 그렇게 섬기며 살라고 당부하셨다(Do This!). 그게 없으면 예수와는 상관 없는 삶이다. “주의 종”이란 말이 오염되어 어처구니 없는 “교회 권력”의 표현이 된 이율배반은, 곧 이 신앙 전통에 대한 배신이다.
세상을 섬기로 온 자신을 드러낸 예수께서는 아예 자신의 몸을 주어 먹고 마시라고 한다.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는 분부가 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이것은 내 몸 혹은 피” “이다”(is)에 집중하며 교리적인 논쟁을 벌여 왔다. 어떻게 떡 혹은 포도주가 예수의 살”이고”(is) 피”이냐”(is)를 두고 지금도 갈라져 싸운다. 자기 식대로 믿지 못하면, 자신의 성찬례에도 초대할 수 없다는 게 법이 되었다. “이 일을 행하라”(DO THIS)는 말씀은 안중에 없다. 이 역시 이 신앙 전통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인류학자 기어츠(Geertz)는 삶에 대한 해석과 기술은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어야 한다고 했다. 당연지사 그건 삶이 투텁기 때문이다. 이미 한껏 두터운 사건(thick event)인 성 목요일의 예수 사건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더욱 복잡해졌다. 오물로도 역사는 쌓여가듯 역설과 아이러니가 범벅이 되어 천연덕스럽게 오늘의 전례 행사를 이룬다. 이 역시 또다른 시간의 중첩을 만든다.
전통적으로 성 목요일에는 성유 축복 미사(Chrism Mass)를 드린다. 기름은 그 복잡한 용도에서 다양한 의미로 발전되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데 쓰였고, 연고의 원료인 탓에 기름 자체가 치료제로 사용되었고, 요즘 식으로 향수로 쓰이기도 했다. 기름의 제의적 사용과 의미 부여가 이어졌다. 세례식에서는 작은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사람)가 되는 상징으로, 병자들에게는 치유 성사의 상징으로, 그리고 성직 서품식에서는 어떤 특권의 전이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 기름을 성 목요일에 축성했던 것은 부활 밤에 있을 세례식과 견진에 쓰도록 하려는 편의에서 비롯했다. 더구나 주교가 축성하는 이 기름을 다 받으러 와야 하니 교회 일치의 상징으로도 보기 좋았겠고,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지역 교회로 돌아가 성찬례 제정 기념 미사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컸겠다. 여러모로 성 목요일은 다양한 전례와 그 의미로 한층 두터워졌다.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발명은 이를 더 두텁게 한다. 성유 축복 미사와 함께 하는 “사제 서약 갱신”이라는 것이다. 성공회에서도 어느 틈엔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이 순서는 사실 1970년대 로마 가톨릭 교황 바오로 6세가 강력히 권장하여 퍼진 것이었다. 교황은 이 날을 “사제들의 축일”로 보았다. 지역 교회에서 성유를 받으러 사제들이 모이는 날인데다, 성찬례 자체가 제정된 날이니, 이 날처럼 교회의 일치(혹은 주교와 사제의 일치)와 사제들의 분명한 권위를 세우기 좋은 날이 어디 있으랴. 이 무렵은 성공회와 천주교가 갈라진지 400여년 만에 대화와 협력을 강력하게 모색하는 시기였으니(교황 바오로 6세와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 이게 성공회에 흘러드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게다.
그러나 이게 성유 축복 미사를 원래대로 잘 드러내는가? 내 경험에서 보나, 교황의 확신에서 엿보이는 생각은 이 날은 “사제들의 축일”이지, 성유의 여러 용법들과 의미들,그리고 사목적인 교회의 일치가 다시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다. 풍요로운 축복과 치유의 상징은 성유의 빈약한 사용도에서 보듯 축소되고 위약해진다. 그 틈 사이로 한편에는 사제들의 자의식 확인이, 다른 한편으로 주교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확인하려는 위계 질서의 기대가 끼어든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의 한 층일뿐, 나무란다고 어찌할 수 있는게 아니다. 성 목요일 자체의 두 사건에 대한 아이러니이되 시간은 이를 삼켜서 오늘을 남기니까.
다시 말해 시간은 이러한 배반과 아이러니 안에서 축적된다. 그리고 현재의 전례 행사와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간다. 시간 안에서 드러내고 숨기는 일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성 목요일은 켜켜이 쌓인 시간들로 촘촘히 박혀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이룬다. 이 시간의 중첩은 한무더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모순된 우리 삶의 자화상을 비춘다. 계몽을 위해 이 날 전례 행사의 어떤 통일된 의미를 찾아내려는 것은 이미 빗나간 욕망이며, 시간이든 역사이든 단번에 뛰어넘어 본질을 정화해내서 보여주겠다는 단언은 광신이다. 오히려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포장하려는 속셈이 빈번하다. 그러니 이 시간의 중첩 앞에서 다만 우리를 비추어 성찰할 일이다.
성 목요일 전례 행사의 마지막은 제대의 모든 장식을 벗기는 일이다. 제대보를 걷으면 제대는 화려함 뒤에 숨겨왔던 몸을 드러낸다. 예수의 몸이 벗겨진 상징이라고 단답형 답을 들이 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시간의 중첩 안에서 스스로를 발가 벗기는 일이 더 중요하리라. 그래야 비춰 볼 수 있을테니까. 그 비추인 나신이라야만 역사와 그에 깃든 상처 사이 사이에 박혀 관계하는 예수의 세족과 성찬례가 흐릿하게나마 다시 돋아나리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십시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