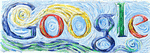잡감 – 죽음, 종교, 그리고 잡종된 기억의 발언
Tuesday, January 31st, 2012죽음은 발언이다. 인생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으니, 죽음은 그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그 생 전체를 두고 던지는 마지막 발언이다. 어떤 점에서, 그 발언에 귀 기울여 기억하고 의례라는 기억장치를 통하여 되새기는 일이 종교이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보려는 생각으로 종교가 창안되었다고 하든, 그보다 더 심오한 신학적 변증을 하든, 실상 종교는 죽음을 둘러싼 생의 종말이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그림자 아래 앉아 삶을 생각하는 틀이다. 그때야 죽음은 계속 발언한다.
역사는 이런 발언의 구성체이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둘러싼 발언에 대한 기억이 없는, 소위 망각의 사회는 역사를 구성하지 못한다. 되풀이되는 인간 사회의 악행은 대체로 집단적 망각에 기대어, 혹은 망각을 조장하는 이들의 농간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세상살이는 늘 기억의 정치와 망각의 정치가 겨루고 다투는 곳에 놓여 있다. 물론, 이 다툼을 초월한 곳을 종교가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종교와 역사의 본연을 덮는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이거나, 소극적이고 무의식적으로나마 그에 부역하는 이데올로기 장치이다. 비루한 삶을 통과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그리스도교는 죽음에 대한 기억의 종교이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다가 스러진 한 인간에 대한 기억의 종교이다. 동시에, 그리스도교는 그 죽음의 발언을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종교이다. 그러나 순혈(純血)의 기억과 발언이란 없다. 늘 다른 사건으로 겹쳐지고 오염되는 잡종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기억과 발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잡종화를 통한 기억의 진화를 거부하는 순혈복원주의가 수구적 정향과 급진적 해석이라는 두 극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서 축자주의는 이런 수구적 교리주의의 행동 방식이고, 성서의 ‘역사적 비평’은 종종 축자주의에 대한 반 명제를 넘지 못하는 지식인의 오락거리가 되기도 한다.
한편, 잡종화에 대한 고민은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못하니, 분명한 전선 형성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다만, 종교는 논증과 설득과 전선 형성이 아니라, 생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자잘한 사건이 역사 속의 기억과 발언과 나누는 유비(analogy)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니 종교는 이러한 유비의 상상력을 부추기고, 그 상상력 체험의 시공간을 마련해 주는 틀이다. 이때,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죽음 자체가 남겨놓는 발언은 인간적이며 신적이다. 삶에 뿌리 내린 인간의 죽음이라는 종말적 전이(transitus)에 놓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신-인적 상상력과 기억은 무수한 죽음의 발언과 원초적 성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남긴 발언을 교차시키는 것이다. 이 작업을 그치면, 신학과 교회는 교권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신-인적 상상력과 기억은 그 과정만큼이나 잡종적인 형태를 무수히 만들어 낸다. 다만, 그 잡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술적 미(美)일 것이다. 찰나와 억겁을 교차시키는 작업으로서 예술, 그 지속되는 발언을 부추기는 가치로서 미를 생각한다. 특히 종교 안에서 의례와 그와 관련된 예술은 이런 잡종적인 예술과 미를 마련하고 실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그것들이 마련하는 시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접목시키는 일이 신앙 훈련이요, 영성 수련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잡감은 늘 행간이 넓고 서로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