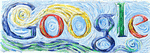어찌 멍에가 편할 수 있나요?
Sunday, July 9th, 2017
어찌 멍에가 편할 수 있나요? (마태 11:16-19, 25-30)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30절).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허덕이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인은 초대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어찌 멍에가 편할 수 있고, 짐이 가벼울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으로 오늘 성서 독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삶의 고통을 덜고 안식을 누리려면 신앙의 새로운 선택과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즈가리야 예언자는 세상의 질서와 하느님의 질서를 비교하며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9:9-12). 세상도 신앙도 정의와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힘센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평화는 군사적인 힘의 대결과 균형으로 위태롭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는 개선장군의 군마가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 등 위에서 시작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를 ‘꺽어버리고’서야 하느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은 ‘피’를 나누는 친밀함 속에 있으니, 그 어떤 인간 생명도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도 바울로 성인은 스스로 자신이 ‘비참한 인간’(로마 7:24)이라고 고백하며, 실은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서로 잘 나고 부자이고 높은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활과 일은 어떤 처지에든 ‘악이 도사리고’ 있어(21절) 괴로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사람이 다 이런 처지일진댄 자신이 이룬 성취와 지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밖에서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자기중심의 시선과 삶을 넘어서서 바깥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세상의 삶을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며, 자기 기분에 따라 남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하는 권력가들을 나무라십니다. 바리사이파는 편하게 앉아 ‘율법의 피리’를 불면서, 남들에게 춤을 춰라, 곡을 하라며 지시하고 비난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금식한다고 비판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먹보와 술꾼’이라고 비난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무슨 연유로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지 되새겨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멍에와 짐은 경쟁과 대결로 만든 정의와 평화입니다. 자신의 모자란 선을 내세우려는 교만이며, 자기 멋대로 힘을 휘두르는 지배욕입니다. 이 어지럽고 억지스러운 일이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이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멍에와 짐을 선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찬 세상의 멍에와 짐을 덜어내고 치워서, 밖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안의 중심 자리에 모시려는 노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신앙인과 더불어 ‘겸손하고 온유하게 배우며’ 대화하는 수고입니다. 이 새로운 노력과 수고의 짐과 멍에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짓눌린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