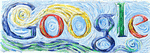1.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Wednesday, February 24th, 2010여기서 쓰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그저 어떤 특정 종교 단체에 참여하여 종교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가리킨다. 또는 제도적 종교 단체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 소속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포함할 수 있다. 역시 새롭게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인 종교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제도적 실체’로서 구체적인 ‘교회’ 단체 혹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 상징으로서 교회, 의미로서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제도적 교회 안으로/안에서 서품을 받은 성직자이다. 이런 사람이 제도적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성직자 옷을 벗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내가 가진 사고와 행동의 반경과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아래 말들은 모두 이런 내 편견의 결과들이다. 여기까지는 일종의 디스클레이머(disclaimer)이다(그나저나 이를 우리말로 뭐라 하지? 도움 주실 분? – 우리말 “발뺌”). 아마 이후 내용도 그럴 것 같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드리는 내 호소는 사실, 한가지다. 세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다. ‘소수자’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인상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 인상 자체가 우리가 가진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거대하게 주류/비주류로 따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판을 새로 짜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은 세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시선과 참여를 통해서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한길로 펼쳐진 행진뿐만 아니라, 잊히거나 숨겨진 골목길을 드러내고, 그 삶의 결들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과 향유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양성의 풍요로움은 이런 작은 것들, 소수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얻을 수 있다. 큰길이 지배하면, 머슴들과 아랫것들은 옆에 난 작은 길로 숨곤 했다. 큰길의 군중에 숨어 있는 사람들보다, 아예 작은 길에서 자라나는 경험과 이야기가 더 다양하다. 아니더라도, 그 작은 길의 목소리는 길에 함성과 더불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의 목소리이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적인 신념 체계의 논리성, 그 자체의 불안한 과거들, 현재의 행태들을 엿보고 겪어서 진절머리가 나더라도, 그것들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까지 덮어버릴 수는 없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는 것,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것에 대한 고민 어린 시선과 참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잊힌 목소리들이 있어야 다양함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