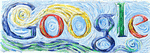성사와 성사성 – 제임스 화이트, 성공회 전통
Tuesday, May 6th, 2008감리교 목사이자 전례학자인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 1932-2004)는 교편에서 은퇴한 해에 펴낸 책(The Sacraments in Protestant Practice and Faith, 1999)을 천주교 신자인 아내에게 헌정했다.
화이트는 책 말미에서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를 인용하며 개신교 신학의 미래가 성사성(sacramentality)에 대한 감각과 실천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공언했다. 틸리히에 따르면, 개신교 신학의 운명은 “자연과 성사”(nature and sacrament)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개신교 신학의 완성은 “성사적 (시공간) 영역”(sacramental sphere)의 재발견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화이트는 이어서 현대 (개신교) 교회 안에서 풍요로운 성사적 삶을 막고있는 장애물 세 가지를 열거했다.
[1] 좀더 풍요로운 성사적 삶을 막고 있는 주요 장애물은 성사(sacraments)를 하느님의 현존하는 행동으로 보기를 꺼려하며,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하느님 행동에 대한 인간의 기억으로만 보려는 태도에 있다. 이런 처지에서 성사를 하느님의 자기 주심(God’s self-giving)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성사의 효과에 대한 감각이 개신교인들에게는 너무 없다… 계몽주의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모든 연관을 잘라내 버렸다.
[2] 최근에 일어나는 위협 가운데 하나는 교회 성장 운동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여기서는 교회와 문화의 차이를 극소화하려 한다… 그리고 성사들과 교회력, 그리고 성서정과들이 우리 문화에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를 주변화시킨다.
[3] 좀더 풍요로운 성사적 삶을 막고 있는 세번째 장애물은 대체로 생각없이 대충 대충 성사들을 집전하는 것이다… 준비없이 대충 드리는 성찬례는 그 안에서 이뤄지는 하느님과의 사귐이라는 신앙을 약화시키고 파괴한다. 성사들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성사에 대해 무지한 세대가 되어 버렸다.
근대 전례 운동(the liturgical movement)이 태동하여 영향을 주기 시작한지 100년이 넘지만, 그 깨달음과 울림은 식민지 선교의 유산에 파묻혀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계에는 멀기만 하다. 아니 최소한 주어진 전통에서나마 겨우 그 “감각”을 몸으로 익혀 온 것들 마저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양상이다. 화이트가 지적한 세가지 장애물을 빗대어 우리 교회(최소한 한국성공회의 전례 현실)를 성찰해 볼 일이다.
흥미롭게도 화이트는, 역사적으로 오래 논의되었던 성사(sacraments)와는 달리 “성사성”(sacramentality)이라는 개념이 근대에 이르러 부각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원을 성공회의 프레데릭 모리스(F. D. Maurice: 1805-1872)의 [그리스도의 왕국] The Kingdom of Christ (1837)에서 찾았다. 모리스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물질적인 것(the physical)은 신성한 것(the divine)을 만나는 수단이요. 물질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는 어떤 틈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끄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리고 다시 이 물질 세계는 신성의 체취를 풍긴다” (화이트의 요약).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모리스의 성사성 이해가 사회 정의를 위한 성사적 행동들과 이어졌고, 그것은 성공회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 그리고 이후 전례 운동을 통해서 깊어진 성사적 사회주의(Sacramental Socialism)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 성공회 전통과 기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점차로 잊혀지는 전통이기도 하다. 화이트가 “성사성”를 설명하면서 성공회 전통의 신학자들(Percy Dearmer, A. G. Herbert, William Temple, John Macquarrie)에 기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 성공회 신자들은 어디에 곁눈질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