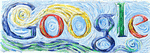불가사의: 수구들의 부흥
한국 사회 현상 가운데 두 가지 불가사의를 든다면 – 적어도 내게 – 이른바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수구 반공 언론의 남부끄러운 줄 모르는 건재 혹은 과시, 그리고 이른바 수구와 근본주의로 무장한 전투적인 기독교(대체로 개신교) 우파 세력의, 역시 남부끄러운 줄 모르는 건재라 하겠다.
이 두 현상은 스스로를 비판적 지성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온갖 낭패감을 안겨 주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과 반성과 더불어, 최소한의 교양을 가진 사회에서는 이 두 현상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낙관이 있었던 듯하다. 적어도 지난 몇 십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내고 있는 민주화와 우리 사회의 수준 – 지표상의 경제력, 학력 – 으로 볼 때, 이런 ‘비이성’과 ‘광신’은 곧 물러날 줄 알았다. 그러니 2MB의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승리를 구가하는 두 세력, 혹은 현상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이가 나뿐만은 아닐테다.
사태는 당혹과 낭패의 심정을 뛰어 넘고 있다. 이 거침 없는 힘들은 이제 발가벗은 채로 반격을 일삼는다. ‘비판적’ 혹은 ‘건강한’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빨갱이’ 혹은 ‘철 모르는’, ‘극좌’, 그도 아니면 ‘한심한 불평분자’라는 딱지로 대체되어 되돌아 오는 형국이다. 이 반격은 가히 무차별과 무경계의 경지에 이르렀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려거나, 존중하려거나, 잠시나마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일이 희미해지고 있다.
‘조중동’은 그렇다 치고라도, 종교라는 탈을 쓰고 보여주는 이른바 수구 기독교인들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노라면 아연실색이다. 그런데 남에게 손가락질만하고 있을 한가로운 처지가 아니다.
우리 성공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성공회는 세간의 좌파 사관학교라는 오명을 벗으라’는 충고가 계기였는지도 모르겠다. 신자들은 보수, 성직자들은 진보라는 이분법을 적용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기 성직자에게 ‘빨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도 혀만 끌끌 차고 만다고 한다 – 이게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도통’한 태도를 취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분노 전략”
이러한 비이성과 광신의 건재, 그리고 이것들의 터무니 없는 윽박지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 대선이 아닌 남의 나라 대선, 혹은 사회를 바라보는 한 시선과 분석과 마음에 와 닿는다. 최근에 읽은 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 폴 크루그먼의 “분노 전략”이라는 글이다. 짧고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공화당 맥케인-페일린 대선팀의 전략은 ‘분노한 우파’를 이용하는 거다. 미국 사회에서 이 우파들의 분노는 더욱 크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 분노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더 큰 요인은 어떤 근거도 없는 감정적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곧 ‘민주당놈들은 보통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한다’는 감정이다.
공화당 정치가들은 근거도 없이,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언동을 일삼는다. 이것이 노회한 거대 정당의 ‘분노 정치의 진수’이다. ‘당신보다 잘난 엘리트가 아니라, 공화당 후보를 찍으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닉슨(Nixon)의 수법이다. 닉슨은 대학때부터 자기보다 잘 나가는 후보를 잘난 체 하는 인간으로 몰아부쳐 결국 이기는 전략을 취했다. 부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인기는 이른바 ‘반지성주의’에 기반한다. 평가 절하된 평균 C 학점짜리 학생들은 다른 우등생들보다 똑똑하다는 게 판명되었다는 식이다.
여전히 이번 대선에서 맥케인-페일린은 이 노회한 전략을 이용하고 있으며 성공하고 있다.
이를 빌려서 우리 사회의 불가사의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왜 그동안 한국의 수구파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일까? 개혁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이 수구 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머리 삼고, 적절한 분노를 행동으로 삼아 왔다면, 수구 세력이 이들에게 갖는 분노는 어떤 것일까? 크루그먼이 이를 닉슨의 열등 의식과 이를 이용한 분노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수구들, 혹은 이를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열등 의식과 분노가 있는가?
아마도 ‘조중동’의 분노는, 크루그먼의 지적과는 달리, 열등 의식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 그 우월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 즉 권력, 부, 지위, 명예, 신념의 ‘많음’에 기반한다(물론 비판적인 교양과 지성은 빼고). 이를 지켜줄 기존 질서가 도전받는 것에 분노한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잃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지키려고 분노하는 듯하다.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다.
한국의 수구 개신교(천주교나, 우리 성공회도 포함시켜야 할 때가 왔다!)에서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반복 교차한다. 그간에 누려웠던 온갖 권력과 명성이 도전받고 있다. 이른바 ‘근대화’ – 도대체 어떤 ‘근대화’인가? – 기여에 대한 자부심, 지칠 줄 모르는 성장과 그 힘, 성공 논리의 확대 등과 더불어, 온갖 비(非)자를 붙여야 편할 그네들의 신학, 신앙, 성찰, 교양, 지성이 그렇다. 성장과 성공이라는 결과로 이 열등감들을 치장으로 덮으려 하지만, 미처 감추지 못한 털난 발과 아직 깎고 다듬지 못한 손톱과 이빨이 드러난다. 이른바 ‘안티-기독교 운동’은 자초한 일인데도, 수구 개신교인들은 이를 기회 삼아 자못 새로운 분노의 힘을 충전하고 있다. 수구들은 이 참에 대단한 분노의 통일 전선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커지고, 더욱 힘이 세지고, 더욱 분노로 똘똘 뭉친다.”
비판이 조롱으로 느껴질 때
그러나 이들의 분노를 탓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다. 분석까지도 좋다. 그런데 지금은 비판의 방법과 전략들을 되돌아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묻는 일이어서, 수준과 범주가 다른 여러 지점에 생각이 미친다.
학계 혹은 교수들을 보자(신학계로 제한할까?). 비판적이라는 수사를 짐짓 권위있게 독점해 오다시피 한 이른바 ‘학계’의 담론과 전략은 적절한가? ‘상아탑’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내내 스스로를 상품화하려고 적절한 ‘비판’이라는 수사학으로 보통 사람들을 따돌리지는 않았는가? (지나친 일반화이니 억울해 할 분도 많겠으나, 억울해서 죽을 만큼은 아니니 눈 좀 감아주면 좋겠다. 하긴 그런 분들이 이 하찮은 블로그를 둘러다 볼 리 없다). 보통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혹은 기본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대화하기 보다는, 생소한 최신 이론과 개념으로 기죽이는 일이 많지는 않은가?
이 참에 한국의 ‘인터넷 문화’도 돌아볼 여지가 있겠다. 인터넷이 우리의 민주화를 이끌었는가? 몇가지 사례들에만 집중해서 과대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인터넷 댓글 문화는 이미 여러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는데, 그 행태들은 이른바 ‘수구파나, 자유파나, 진보파나’ 엇비슷한 것은 아닐까? 인터넷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분노가 과장되고 왜곡된 채로, 스스로 돌아볼 틈 없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을 마주하고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 넘친다. 절제되지 않는 말들은 비판이 되지 못하고, 대체로 가시로만 남아 분노를 일으킨다.
여러 텔레비전 토론회들을 통해서 스타들이 출몰하곤 한다. 그 ‘스타성’의 비밀은 무엇인가? 혹시 나를 대신해서 상대를 신나게 조롱해 주는 사람이 그 토론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조롱하는 스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그 통쾌함을 선사하는 정도가 ‘스타성’을 등급 매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조롱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얼마나 알고 접근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들의 심정은? 하기야 그걸 생각하면 싸움이 되지 않고 이길 수 없다. 또 모든 사안에 적용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토론은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기 위한, 서로 풍요로워지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조롱 끝에 우리는 몇몇 조롱당하는 이들을 반(反) 지성인, 혹은 비(非) 교양인으로 치부하고, 스스로 도도한 체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아니라면 좋은 일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돌아 볼 일이다. 그게 지성과 교양의 덕목이 아닌가.
우리 사회(혹은 교계에, 혹은 우리 교단에)에 편만한 반지성과 반교양, 무식에 눈감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에 대한 진단이라면, 이를 넘어서려는 실천의 전략은 좀더 세련되고 친절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친절의 바탕은 여러 성찰들에 대한 열림이요, 그 형태는 경청하고 대화는 나눔일 것이다. 끈기 있게 이 일을 해나가야 분노가 아닌 새로운 공감이 생겨나리라 본다. 그렇지 않으면 편만한 무식과 반지성이라는 현실에 압도되어, 결국에 여기에 사뿐히 몸을 던지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덧붙임: 용두사미가 되었다. 며칠두고 봤는데 생각이 무르익지 않는다. 내 사적인 반성문의 한 형식이지만, 그냥 날 것대로 생각을 이어나갔으면 해서 올리기로 한다. 민노씨가 잠 못이루는 한 밤 중에 블로그 절필 중인 “아거“를 궁금해 하며, “그의 빈자리가 깊고, 넓다”고 쓴 게 남는다. 사실 아거가 있었더라면 이런 어설프고 설익은 글도 필요하지 않았으리 생각하는 탓이다. 이 혼란한 통에 한 수 배울 자리를 탐하면서, 나도 아거의 글들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