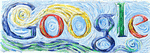교회 분열에 대한 우스개 소리 하나
Monday, December 4th, 2006어느 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 난간을 넘어 뛰어 내리려는 참이었다. 나는 황급히 뛰어가서 그를 말렸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 이유가 있소?” 하고 그가 묻자, 나는,
“그럼요, 살아야 할 이유야 많죠?” 하고 대답했다.
“그게 뭔데요?”
“종교가 있나요?” 내가 묻자,
“예,” 그가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교 신자요, 아니면 불교 신자요?” 하고 물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래요. 그럼 가톨릭이요, 개신교요?” 하고 다시 묻자, 그는
“개신교인데요.”
“나도 그래요. 그럼 성공회 신자요, 침례교 신자요?” 하고 묻자,
“침례교 신자요.”
“와, 나도 그래요. 교단이 하나님의 침례교요, 주님의 침례교요?” 하고 묻자,
“하나님의 침례교요.”
“나도 그래요. 그럼 원조 하나님의 침례교요, 아니면 개혁 하나님의 침례교요?” 하고 묻자,
“개혁 하나님의 침례교요” 하고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그럼 1879년 개혁파요? 아니면 1915년 개혁파요?”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는 “1915년 개혁파인데요” 하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래 죽어라 이 쓰레기 이단아!” 하고 말하면서 그를 떠밀어 버렸다.
초대 교회는 조화롭고 통일된 하나의 교회였다는 믿음은 신화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양이 처지에 따라 다양했기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은 어디에나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양상이었다. 갈등은 초반 몇 세기에 대단한 신학적-교리적 논쟁을 겪으면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황제의 권력에 의한 일시적인 봉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 교리적 논쟁이 그런 분열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름에 분명한 경계를 긋고, 그것을 틀린 것을 정죄하면서 더욱 곪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사이에서 어느 교회 전통도 그 본래 의미의 “가톨릭”이 아니다.
이런 논쟁과 분열의 양상은 대체로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분법을 주무기로 하여, 정죄와 파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실제 그 집행 과정은 지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십자군 – 그게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의 탈환이었지만, 실제로는 정교회 신자들을 도륙했다 – 으로부터, 종교개혁과 연관된 끊임없는 종교 전쟁을 낳았다. 오죽하면 이러한 종교에 의한 살육의 전쟁이 끝나서 각각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계기인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1648년)에 이르러야 진정이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의 힘은 이를 계기로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역사가들은 이를 서구 근대의 출발로 보는데 입을 모은다. 종교 권력이 끝나는데 근대의 시작이 있다면, 다시 패권적 종교 권력을 구사하려는 힘들이 부흥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회귀가 되는 것일까?
시시껄렁한 우스개 소리 하나 소개하려다가 참 거창한 이야기가 나와버렸다. 여전히 손쉬운 이분법과 편 가르기, 그리고 정죄와 파문이 사그라들지 않는 종교계 (대체로 그리스도교계)는 여전이 “근대” 이전에 있는 듯하다. 교회의 분열 상에 대한 이 농담은 한국의 교회 분열을 그대로 비춘다. 분열은 대체로 커다란 공통점보다는 작은 상이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 상이점들은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극대화되고 폭력적이 된다. 이런 극렬함은 대체로 경전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 근거를 두어 자기 해석 이외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본주의이다. 근본주의는 정치, 종교, 주의를 막론하고 또다른 하나의 종교이다. 그리고 한기총이라는 다른 종교가 있다. 나는 “부시의 기독교”와 “오사마 빈 라덴의 이슬람교”를 같은 종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