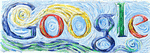October 13th, 2007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시인 선생님이 있었다. “우리들”은 그 시인의 말처럼 우물 밑으로 손을 뻗어 가난한 우물끼리 연대하며 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다시 그 시인처럼 “우리들” 가운데 여럿은 삶의 그늘들과 씨름하다 쓰러지거나, 몸을 상하거나, 사람들의 황홀한 기대와 불편해 하며 살았다.
모두들 시인이고자 했다. 시인 선생님이 알려준 시인들과 거기에 덧붙여 읽게 된 다른 시인들은 우리를 겉자라게 했는지 모른다. 왜 그때 읽은 황지우, 김정환, 최승자 등이 더 깊이 남아 있을까? 한참 뒤에도 왜 나는 “K를 위하여”의 최승자처럼 철없이 설익은 도끼날을 허공에 찍어대는 것일까?
한편 여럿 시편들 말고, 시집으로 마지막 읽은 걸로 기억하는 건 김중식의 [황금빛 모서리]였던 것 같다. 그 시집들은 바다 건너에 데려오지 않았다! 그동안 삶이 푸석해져버린 것이다.
느지막이 결혼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려는게 되지는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든다. 자취집에 모여 점심 먹고 둘러 누워 돌려가며 시를 읽었던 그 친구들을 회상하여 한마디 축하 인사해주려는 참이었던데, 자꾸 생각이 이그러진다. 못쓰고 만다.
회상은 지금의 처지때문에 오히려 쓴 맛을 남긴다. 그래서 더욱 짠하게 그리운 친구들이다.
결혼 축하해, **야! 신부에게도!
너를 한번도 내 기도에서 잊은 적이 없어!
다른 녀석들도 다들 모이겠구나.
나도 곧 볼 수 있을거야.
Posted in 일상 | No Comments »
October 7th, 2007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는 버클리 대학(UC Berkeley)에서 가르치다 은퇴한 사회학자이다. 그리스도교 신자인 그는 종교의 사회적 현상, 특히 미국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종교의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미국 사회와 종교의 지속적인 개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거듭해왔다. 성공회 신자이기도 한 벨라 교수는 이러한 사회의 공공성을 공동선에 입각해 재구축하는 일에 종교와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 글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동체 예배를 중시하는 성공회 전통의 신자였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민주 사회 안에서 예언자적 종교”(Prophetic Religion in a Democratic Society, 2006)라는 에세이 끝에서,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종교 전통들이 공동의 삶에 가장 깊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면서 내 말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좀더 넓은 시각을 공공 영역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의 자리이고, 영적 실천의 자리라고 믿는다. 주요 종교들 안에서, 예배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배는 공적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적극적 행동의 원천이요 목표이다. 예배는 우리가 지극히 의식적으로 궁극적 실재와 연결되는 곳이며, 이 힘든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을 갖고 나가도록 하는 힘을 얻는 곳이다.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의 비전이 살아 움직이며, 거듭날 수 있는 곳이다. 앞서 나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고전 철학 사상을 두고 화산의 “용핵”(molten core)이라 표현한 이미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도움이 된다. 바로 예배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용핵”과 만난다. 바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종교적 상상력이 응축되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때로 이러한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종교 전통에 있든지 간에 그 신앙인들이 자신들을 규정하는 종교적 실천들을 무시한다면, 그 신앙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신앙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란 무엇인가? 종교 사회학자로서 나는 종교와 영성 전통이 대체로 기존 질서(status quo)를 옹호하는데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침묵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종교와 영성 공동체들을 통해서 위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 나오고, 그 사회에서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실재에 비추어 이 문제들을 검토하는 이들이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때로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거부하고 비판했다. 아무래도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이 거부와 비판 사이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대낮같이 환하게’ 실천한다.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대안적 현실을 좀더 넓은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없이는 공공 영역은 급격히 퇴락하고 만다. 신앙인들 어느 누구도 그 혼자서는 답을 낼 수 없다. 하지만 함께하여 서로에게서 배운다면, 신앙인들은 우리가 맞딱드린 곤경에서 우리를 꺼내어, 덜 파괴적이며,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를 위해 좀더 건설적인 삶의 형식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종교사회학을 기능주의로 보든, 그의 주장을 어떤 책임주의 명령에서 나온 것으로 바라보든 간에, 전례 전통의 교회들이 예배를 두고 사회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질서(order)의 표현이요, 그 질서의 본연인 “천상 전례”의 반영이라는 시각을 발전시켜왔으니, 그의 생각이 이런 교회 전통의 이해에서 비롯되거나 맞물려 있을 법도 하다. 전례 혹은 예배는 새로운 사람살이의 틀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실천이다.
후기; 벨라 교수를 주일 교회 미사에서 그리고 몇몇 특별 강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의 충실한 독자는 아니었으나, 다시 지난 몇몇 글들을 들춰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눈에 띈다. 그는 마르크스-베버-뒤르켕을 학문적 토대로 하며, 틸리히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재발견하여 성공회 신자가 되었고, 알리스터 맥킨타이어(After Virtue)의 윤리학적 전망을 줄곧 인용한다. 깊이에 차이가 심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궤적과 관심의 흐름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Posted in 번역, 전례 | No Comments »
October 6th, 2007
10월말 서울교구에서 있을 전례 세미나 준비 중. 정해진 얼개와 흐름을 다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자료 찾아 읽기. 우리말로 된 마땅한 자료가 부족한 처지이니, 간명하면서도 깊고, 풍부한 신학적 원칙들을 사목적 현실과 연결시키는 자료들을 선별하기. 번역하기. 그 와중에 세미나 청중들의 처지와 요구를 듣기 위해서 통화. 그 통화는 교회와 성직자들의 처지와 상태에 대한 염려로 길어지고…
오늘은 일단 “공동 기도를 위한 교회 – 예배 공간에 관한 선언”의 번역을 밤늦게야 마치고, (교정-편집-발송은 나중에…)
내일은 하루 종일 있을 “국제 프란시스칸 심포지움: 프란시스칸 전통에서 바라본 세계화 문제”에 참석해야 한다.
Posted in 일상 | No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