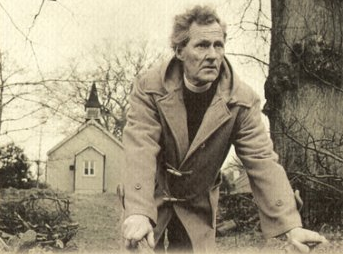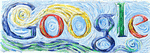성소 주일 잡감 – [주교] 성직 소명 체크 리스트
May 14th, 2011몇 년 전 천주교 신부 친구가 웃자고 들려준 말이다. 신학교 졸업 설교를 하던 학장 신부님께서 아주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란다. “여러분을 내보내는 제 마음이 두렵도록 떨리고 아픕니다.” 신학생(부제/사제)들은 마침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마태 10장)는 말씀을 복음으로 들은 터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 뒤, 학장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이리를 양 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아픕니다.”
언제나, 특히 서품 기념일이 있는 5월이면 이야기가 떠오른다. 게다가 한국은 오늘 부활 4주일을 ‘착한 목자 주일’과 ‘성소 주일’로 지킨다(주일 복음 본문 요한 10:1~10).
성소 주일에 생각하는 ‘성소’란 무엇인가? 성소는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이 나누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요, 선교 명령일 테다. 그 가운데 ‘성직 성소’가 하나로 있을 뿐이다. 그것은 여럿 가운데 하나이지, 질적으로 다른 성소가 아니다.
5월이면, 이 착한 목자 주일, 성소 주일과 더불어, 성직 서품이 있다. 오랜 식별 과정과 기간의 중요한 마디점이다. 모든 성소 식별이 그렇듯, ‘성직 성소 식별’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니, 성직 서품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그 계속되는 식별에 성직을 걸어야 한다.
이 식별이 늘 말썽거리란다. 우리는 어떻게 성직 열망자를 식별하여 신학교에 보내는가? 신학교의 성직 ‘양성’ 과정에는 어떤 식별 과정이 적용되는가? 졸업 후 다시 전임 전도사 생활 1년 반을 거쳐 성직의 첫 관문인 부제 성직, 그리고 다시 2년 후 사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식별의 과정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헤아려 보고 있는가? 이 성소 식별은 판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을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품으신 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일 테다. 이 식별을 도와주는 성소위원회은 어떻게 운영되며, 성소위원들 자신은 어떤 식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성소자 면접에 응하는가?
성직 성소의 식별은 부제품과 사제품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회는 멀게는 십수 년 짧게는 수년에 걸쳐 한 번씩 주교를 뽑는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선거가 되어 버렸다. 주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제품과 사제품에 해당하는 성소 식별 과정이 존재하는가?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 역시 식별이어야 하고, 적절한 식별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를 식별하는 일에 그 교회의 미래가 달렸다.
이 과정에서 성소자 스스로 묻고, 그 식별을 돕도록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것일까? 성직 서품받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개인 식별에 있을 이이든, 서품 기념일을 맞는 이이든, 주교직에 있는 이이든,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것일까? 이미 그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블로그 이곳저곳에 적었으니, 오늘은 다른 이의 말도 들어본다.
주교 선출을 맞아, 영국 성공회의 은퇴한 사제가 던지는 질문은 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 성직후보자, 그리고 신자들이 늘 되새겨야 할 말이다.
주교 선출 위원회의 면접위원들은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기를 바란다.
첫째, [주교] 후보자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왔는가? 과거의 고통이 지금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살펴보지 못한 고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 그렇다면 힘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잘 보듬는 사람이라면 좋겠다.
둘째, 후보자의 전반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그가 만드는 분위기와 환경은 어떤 것인가? 그가 가진 희망과 평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꽃을 피우도록 돕는가? 아니면 그가 발설하거나 풍기는 비판 속에서 사람들이 말라 죽는가? 뽑혀야 할 사람은 예수 이야기를 멋지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구를 판단하려는 ‘영’은 종교적 권위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늘 유혹이다. 이 판단하려는 영은 훼손된 영혼에 사로잡혀, 덕을 세우기보다는 두려움을 만들어 낸다.
셋째, 후보자가 면담하는 동안, 그 면접위원들에게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훌륭한 예술 작품이나 철학, 그리고 종교는 고향에 대한 독특한 열망에 관여한다. 사람은 그 내적인 열망의 불꽃이 있으나 사는 동안 이것이 억압당하기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주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회복하도록 돕는 주교가 필요하다.
넷째, 그의 꿈(vision)은 무엇인가? 진실한 꿈은 다음 세 가지를 수행한다. 사태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연대하도록 연결해 준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 꿈이 솟아난다. 사람들은 다만 그 지도자와 더불어 원래 자신의 모습을 창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후보자는 자신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생각, 곧 무너질 내용, 전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멋지게 표현한 것일 뿐임을 지각하는가? 진실은 어떤 공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진실은 오직 그가 슬쩍 비추는 웃음과 인사, 표정 속에서 드러난다. 좋은 후보자는 말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 그는 여러 틈과 사이에서 삶이 자라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이가 주교관을 써야 한다.
—
원문: 사이먼 파크, http://goo.gl/mXW74
번역: 주낙현 신부
후원: 송경용 신부 (서울교구, 걷는 교회, 나눔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