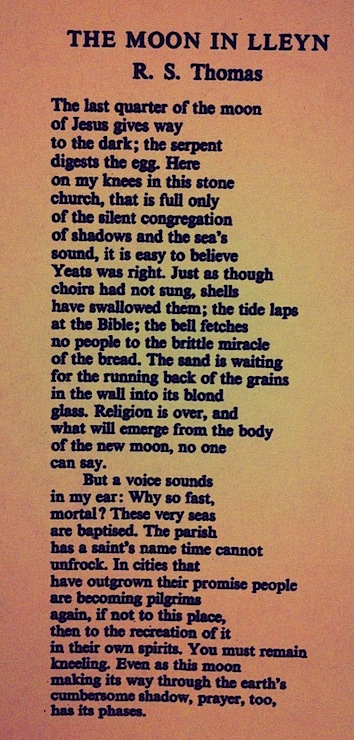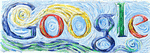위계, 민주주의, 깨어있는 영성
Wednesday, September 5th, 2012(거의 세기말에나 있을 법한 행태가 우리 교회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이나 속이 쓰렸다. 바다 건너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려 하나,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이 블로그 제목이 ‘성공회 이야기’이니 속 쓰리더라도 그 치부에서 나온 몇 생각을 트위터에서 옮겨 놓아야겠다.)
교회의 ‘위계’ 전통, 특히 성직의 위계는 기본적으로 사목적 보살핌과 하느님의 선교를 위한 가치에 종속된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이 처한 사회의 맥락에 휘둘려 그 사회의 억압적 위계 문화를 자신의 위계질서에 그대로 적용하여 오용하곤 했다.
위계질서 자체가 봉건적인 것은 아니다. 봉건사회의 주종 관계 행태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탓에 위계 질서를 그렇게 오해하고 남용한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이런 오용이 설 자리가 없고, 오히려 ‘보살핌’을 위한 위계를 회복할 기회일 테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각종 위계, 특히 교회 내의 위계가 ‘봉건적 행태’를 답습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시대착오적 행태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이런 교회에 희망이 있을 리 없다.
우리 사회에는 적어도 ‘군사문화’가 심은 두려움과 어쩔 수 없이 습득한 ‘군대문화’의 일상적 폭력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 이 어둠은 무의식에 내려앉아 두려움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바로 참된 영성의 적이다.
이 어두운 무의식의 극복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인 한편, 종교가 대안적 가치 공동체로서 존재할 이유가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교가 가장 못된 힘 부림을 일상화하는 일이 잦다. 특히 성직 사회에서.
이런 곳에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있을 리 없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은 반골, 혹은 현실 부적응자로 찍혀 치도곤당하기 일쑤다. 이 치도곤은 ‘도통’한 자들의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당의정을 입곤 한다. 이 정도면 ‘자신에게 깨어있는 영성’은 없는 것.
현실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관계는 모두 ‘권력관계’이다. 이 권력관계에 종속된 현실을 비판하고 넘어서려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더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고 하셨다. 자신의 권력을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이 신앙과 영성의 시작이다.
이것이 ‘자신에게 깨어있는 영성’이며, 우정의 영성이다. 자신의 권력을 깨어 살피는 신앙과 영성에서 바로 권력이 아닌, 권위가 나온다. 이것이 아닐 때, 종교인들은 ‘도통한 척’하는 권위주의자, 관료주의자이기 일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