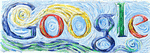성삼일 – 다시 들춰본 생각
Friday, April 10th, 2009그리스도교는 기억 위에 세워진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억이 그 기반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듯이, 그래서 결국 처형으로 마감되었듯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늘 “위험한 기억”(dangerous memory – Johann Baptist Metz)이다. 그 기억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다가 스러진 인간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는 그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시간은 기억의 적이다. 시간은 망각을 부추기고, 거기에 기대어 많은 것들을 숨기기 때문이다. 이 시간의 망각을 저지하려는 안간힘과 기억의 장치가 바로 교회력이요 전례력인 셈이다. 그 안간힘을 보지 않고서 전레력을 보면, 그건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전통의 찌꺼기에 불과할 것이다. 역사에서 힘있는 이들은 이러한 기억의 장치를 다시 억압의 장치로 바꾸기도 했으니, 전례와 전례력은 만신창이가 되어 저항과 억압이 가없이 되풀이되며 섞이게 되었다.
이 역사의 오랜 갈등이 태연하게 전례의 전통 여기 저기에 남아 있기도 하다. 아니, 그래서 언제든지 균열을 이루며 비집고 나올는지 모른다. 아마 그래서 전례를 둘러싸고 늘 다툼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두텁듯, 전례는 두텁게, 혹은 무감각하게, 혹은 생채기를 건드리며 아직 살아남아 있다.
“위험한 기억”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적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성삼일을 두고 적었던 생각들을 되돌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