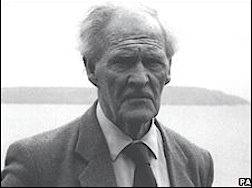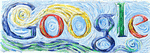October 6th, 2010
파르티잔 – 레너드 코헨
The Partisans – Leonard Cohen
그들이 국경을 넘어왔을 때,
나는 항복하라는 경고를 받았지.
결코, 그럴 수는 없었어.
그래서 총을 집어 들고 사라졌지.
이름을 많이도 바꾸었고
아내도 잃고 아이들도 잃었어.
하지만, 내게는 많은 벗들이 있지.
그리고 몇몇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어느 할머니는 우리에게 쉴 곳을 주었고
우리를 다락에 숨겨 주었지.
그리고 군인들이 닥쳐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었어, 아무 말도.
오늘 아침에는 셋이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나 홀로 남았지만
나는 계속 가야 해.
전선이 나의 감옥인 걸.
아, 바람, 바람은 불고,
무덤들 사이로 바람이 불고
자유는 곧 오리니,
그때 우리는 그늘에서 나오리니.
독일군이 우리 집에 와서는
“항복하라”고 말했지.
결코, 그럴 수는 없었어.
나는 무기를 다시 집어 들었지.
백번은 이름을 바꿨을 거야.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었지.
그러나 내겐 많은 벗들이 있지.
내게는 프랑스의 모든 것들이 있어.
어느 할머니는 다락에
그날 밤 우리를 숨겨 주었지.
독일군이 그를 잡아갔고,
그는 두려움 없이 죽었어, 두려움 없이
아, 바람, 바람은 불고,
무덤들 사이로 바람이 불고,
자유는 곧 오리니,
그때 우리는 그늘에서 나오리니.
레너드 코헨이 불러 더 널리 알려진 이 노래는 원래 프랑스 레지스탕스 일원이자 기자였던 엠나누엘 다스티에 드 라 비게리(Emmanuel d’Astier de la Vigerie)가 1943년에 가사를 쓰고, 안나 말리(Anna Marly)가 처음으로 노래했다.
Posted in 번역, 역사, 영성 | No Comments »
August 23rd, 2010
성공회 전통의 신학과 신앙의 언어는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의 언어와 사뭇 다르다. 그 다른 특징을 변별하여 ‘시적 언어’가 성공회 신앙의 언어요, 그런 점에서 아예 성공회의 영성을 “시적 상상력”으로 이름하여 풀어 내기도 한다.
신앙이 철학의 언어와 법률의 언어에 예속되는 동안, 신을 논리에 가두어 배타적인 진리의 소유를 주장하는 무리가 득세하거나, 법적인 채무 관계로 해석하여 범죄와 처벌에 따른 심판자 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곤 했다. 이는 대체로 확실성의 언어이다.
그러나 시적인 언어는 불확실성의 언어이다. 그것이 비추는 신앙과 하느님은 철학적 논리와 법적 관계에 균열을 낸다. R.S. 토마스의 말을 빌자면 “지식의 상처”(the wound of knowledge)에 관여한다. 그리하여 좁은 행간 사이로 드리워진 의미의 비약과 심연은 하느님과 인간의 거리감을 암시하는가 하면, 종이에 찍힌 그 물리적 행간은 금세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좁디좁다고 비춘다. 비약과 모순의 이미지와 상징과 언어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다만, 그 시적 언어에서 가만한 응시, 혹은 어찌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시선을 본다. 그것이 하느님의 시선과 닮았으리라 생각하며.
성공회 전통에서 이런 시적 언어의 대가들은 존 던(1572-1631) 조오지 허버트(1593-1633), 토마스 트라헌(1636/7-1674)으로부터 T.S. 엘리엇(1988-1965), W.H. 오든(1907-1973), 그리고 R.S. 토마스(1913-2000)에 이른다. 어떤 이는 성직자요, 어떤 이는 신실한 신자였으나, 모두 하느님과 삶에 관한 의심과 의문을 감추지 않고, 그 갈등을 시의 언어로 토로했다. 그 의심 사이에서 떠오르는 하느님이라는 시상을 나누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신 경험-인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때가 되어 늘그막이 소일할 일마저 없게 되면, 이런 성공회의 시적인 언어들에 기대어 나 자신을 비추고 하느님을 엿보려 번역했던 시들을 몇 수 모아 해적판 시선집이라도 내볼까 한다. 나 스스로 좋은 시를 쓸 수 없음을 한탄하지 않아도 되려니와, 하느님께서 성공회 전통 안에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것만으로 벅찬 일일는지 모른다.
Posted in 번역, 성공회, 신학, 영성 | 2 Comments »
August 23rd, 2010
최근 여러 차례 바다 건너로 여러 동료 성직자 벗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여러 고민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마당에 조용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는 했다. 잠시 쉬는 참에 찾아 읽는, R.S. 토마스(성공회 사제, 시인)의 시 한 편은 그들에 대한 생각을 사무치게 한다. 시인의 얼굴처럼 그들과 나도 변하고 늙어가겠지. 울컥하는 마음을 가다듬어, 허튼 번역을 올린다. 마지막까지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들은 복되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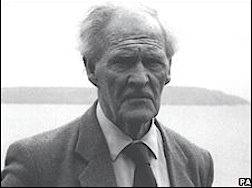
시골 성직자
R. S. 토마스
보나니, 그들은 낡은 사제관에서 일하고 있네
햇살을 옆에 두고, 촛불을 곁에 두고
고귀한 이들, 그들의 검은 옷은
약간의 먼지에 덮이고, 색바랜 푸른 빛마저 감돌고
곰팡이마저 거룩하게 피어 있네. 그러나 그들의 두개골은
그 많은 기도로 원숙하나
무덤에 묻혔으니
무지렁이 시골뜨기들과 나누는 무덤. 그들은 아무 책도 남기지 않았네
그들의 외로운 생각이 담긴 비망록도
그 낡은 회색 성당에. 다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고결한 말들을 적었으니
너무 빨리 잊히리. 하느님께서 그의 때에
혹은 시간이 끝나는 날, 이를 고치시리라.
—
R. S. Thomas (1913-2000), “The Country Clergy” (1958)
번역: 주낙현 신부
Posted in 번역, 성공회, 영성, 일상 | 3 Comments »